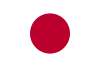기온마쓰리

기온마쓰리(祇園祭)는 일본 교토부에서 열리는 축제이며,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이다.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기원제를 열었던 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마쓰리로 자리잡게 되었다.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하며, 16일날 하는 '요이야마'와 17일날 하는 '야마보코 순행'이 유명하다. 야마보코 순행은 야마보코가 모여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다. 기온마쓰리의 상징인 야마보코는 높이 20m가 넘는 것이 있을 만큼 무거워 수레(다시)로 끌고 있다.
| 이 글은 일본 문화에 관한 토막글입니다.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. | |
| 이 글은 축제에 관한 토막글입니다.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. |